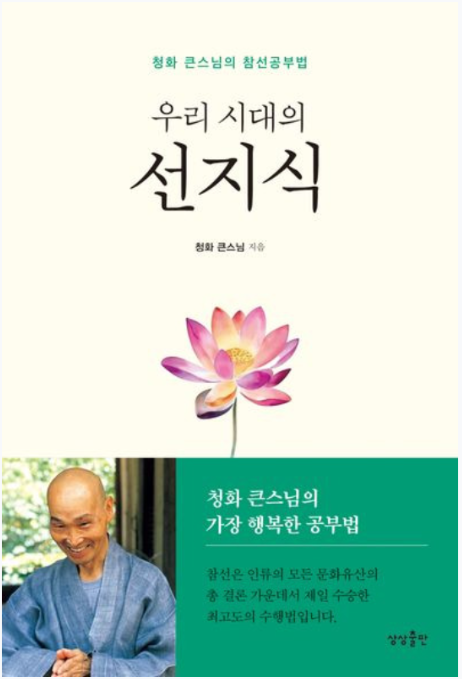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경북 문경시 동로면 석항3리 한산사의 정식명칭은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시방총림 불이마을-한산사 용성선원’이다. ‘현대적 의미의 간화선 근본도량’이자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수행공동체’이다. ‘수행이 곧 생활’을 추구하는 사부대중 수행공동체다.선원장은 선회(禪會)를 통해 지리산 벽송사를 널리 알린 월암스님. 조계종 (공저)와 선수행의 교과서로 칭송받는 의 저자로도 잘 알려졌다. 북경대 철학과에서 공부, 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백양사, 화엄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선원과 중국의 남하사, 진여사, 운문사, 백림사 등에서 수행했다.벽송사 벽송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행복선수행학교 교장 등으로 간화선 대중화의 선봉에 서 있는 월암스님을 지난 8월25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