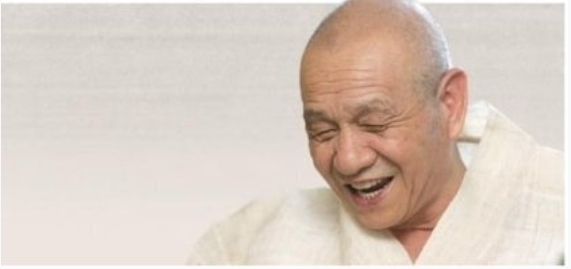
무산(霧山) 조오현 스님의 시 몇 편
무산 조오현 스님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
파도
밤늦도록 불경(佛經)을 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千經) 그 만론(萬論)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허수아비
새떼가 날아가도 손 흔들어주고
사람이 지나가도 손 흔들어주고
남의 논 일을 하면서 웃고 섰는 허수아비
풍년이 드는 해나 흉년이 드는 해나
―논두렁 밟고 서면―
내 것이거나 남의 것이거나
―가을 들 바라보면―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도 웃는 허수아비
사람들은 날더러 허수아비라 말하지만
저 멀리 바라보고 두 팔 쫙 벌리면
모든 것 하늘까지도 한 발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을
비슬산(琵瑟山) 가는 길
비슬산(琵瑟山) 구비 길을 스님 돌아가는 걸까
나무들 세월 벗고 구름 비껴 섰는 골을
푸드득 하늘 가르며 까투리가 나는 걸까
거문고 줄 아니어도 밟고 가면 운(韻) 들릴까
끊일 듯 이어진 길 이어질듯 끊인 연(緣)을
싸락눈 매운 향기가 옷자락에 지는 걸까
절은 또 먹물 입고 눈을 감고 앉았을까
만 첩첩 두루 정적 비워 둬도 좋을 것을
지금쯤 맷새 한 마리 깃 떨구고 가는 걸까
적멸을 위하여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 다음 숲에서 사는
새의 먹이로 가야겠다
계림사 가는 길
계림사 외길 사십 리 허우단심 가노라면
초록산 먹뻐꾸기가 옷섶에 배이누나
이마에 맺힌 땀방울 흰구름도 빛나고
물 따라 산이 가고 산을 따라 흐르는 물
세월이 탓 없거니 절로 이는 산수 간에
말없이 풀어 논 가슴 열릴 법도 하다마는
한 벌 먹물 옷도 내 어깨에 무거운데
눈감은 백팔염주 죄일 사 목에 걸어
이 밝은 날빛에 서도 발길이 어두운가
어느 골 깊은 산꽃 홀로 피어 웃는 걸까
대숲에 이는 바람 솔숲에 와 잠든 날을
청산에 큰절 드리며 나 여기를 왔고나
재 한줌
어제 그저께 영축산 다비장에서
오랜 도반을 한줌 재로 흩뿌리고
누군가 훌쩍거리는 그 울음도 날려보냈다
거기, 길가에 버려진 듯 누운 부도
돌에도 숨결이 있어 검버섯이 돋아났나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언젠가 내 가고 나면 무엇이 남을건가
어느 숲 눈먼 뻐꾸기 슬픔이라도 자아낼까
곰곰이 뒤돌아보니 내가 뿌린 재 한줌뿐이네

무산 조오현 스님의 다비(2018. 5.26)
절간 이야기
어제 그끄저께 일입니다. 뭐 학체 선풍도골은 아니었지만 제법 곱게 늙은 어떤 초로의 신사 한 사람이 낙산사 의상대 그 깎아지른 절벽 그 백척간두의 맨 끄트머리 바위에 걸터앉아 천연덕스럽게 진종일 동해의 파도와 물빛을 바라보고 있기에
"노인장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침나절에 갈매기 두 마리가 저 수평선 너머로 가물가물 날아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여태 돌아오지 않는군요."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초로의 그 신사는 역시 그 자리에서 그 자세로 앉아있기에
"아직도 갈매기 두 마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어제는 바다가 울었는데 오늘은 바다가 울지 않는군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간 이야기 3
아득한 옛날의 무슨 전설이나 일화가 아니라 요 근년에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 공부하는 암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숲속에 파묻힌 돌담 주춧돌도, 천년 고탑도 비스듬한 그 암자의 마당에 들어서면 물소리가 밟히고 먹뻐꾹 울음소리가 옷자락에 배어드는 심산의 암자이지요. 그 암자의 마당 끝 계류가에는 생남불공(生男佛供) 왔던 아낙네들이 코를 뜯어먹어 콧잔등이 반만큼 떨어져나간, 그래서 웃을 때는 우는 것 같고 정작 울 때는 웃는 것 같은 석불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암자가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그 두루적막 속에서 20년을 살았다는 노 비구니 스님이 그해 늦가을 그 석불 곁에 서서 물에 떠내려가는 자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을 때 다람쥐 두 마리가 도토리를 물고 돌담 속으로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옳거니! 돌담 속에는 도토리가 많겠구나. 묵을 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먹어야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중얼거린 노비구니스님이 돌담을 허물어뜨리고 보니 과연 그 속에서는 도토리가 한 가마는 좋게 나왔지요. 그런데 그 한 가마나 되는 도토리를 몽땅 꺼내어 묵을 해 먹었던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놈의 다람쥐 두 마리가 노비구니스님의 흰 고무신을 뜯어먹고 있었답니다. 그 흰 고무신을 뜯어먹다가 죽었답니다.
절간이야기 29
한나절은 숲 속에서 새 울음소리를 듣고
반나절은 바닷가에서 해조음 소리를 듣습니다
언제쯤 내 울음소리를 내가 듣게 되겠습니까
***
탐구
무애도인(無碍道人) 조오현 스님은 경남 밀양에서 출생, 7살에 입산하여 1959년 성준 스님을 은사로 직지사에서 출가했으며, 불교신문 주필과 신흥사 · 계림사 · 해운사 · 봉정사 주지를 거쳐 설악산 신흥사와 백담사 조실과 조계종 원로의원을 맡았습니다.
무산은 백담사에서 출가한 만해 한용운을 기리려고 1996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설립해 시작하여 매년 8월이면 강원도 인제에서 전국의 문인,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전을 열어 만해대상을 시상했습니다. 또 백담사 초입에 2003년 만해마을을 만들어 문인들의 창작공간으로 내놓았으며 1999년 <불교평론>을 창간하고, 만해가 창간했던 <유심>을 복간하였습니다.
무산은 종교와 승속, 분단국가의 벽을 넘어선 장쾌한 대장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만해대상을 김대중, 리영희, 이소선, 그리고 문인으로 고은, 김지하, 조정래, 종교인으로 강원용 목사, 함세웅 신부, 법륜 스님, 두봉 주교, 진보적인 인사인 백낙청, 신영복 등에게 시상하였습니다. 모두 종교의 벽을 뛰어 넘으려는 무산 스님의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 무산 스님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동 등 제3 세계에서 군부와 독재자들의 폭압 아래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평화와 인권운동가들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그들의 운동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무산의 법문은 허식을 벗어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산은 노망기 있는 자기의 설법을 듣는 것보다 동해 바다의 파도소리, 설악산의 산새소리, 계곡 물소리를 듣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장경의 글과 말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절간을 나가 만나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의 가슴 아픈 삶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질책하면서 세상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말년에 무산은 말년에 매년 3개월씩 두 차례씩, 즉 일 년의 절반을 백담사 무문관에서 보냈습니다. 무문관은 밖에서 열쇠를 잠그고 구멍으로 들어오는 하루 한 끼의 식사를 받으며 3개월간 참선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무산의 숨겨진 일화는 더 있습니다. 무산은 전태일기념사업회에 몰래 매달 후원금을 보냈으며, 백담사 근동의 산골의 수백 명 아이들에게 대학 재학 때까지 남몰래 장학금을 기부해왔습니다. 또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들이 1인당 15만~5백만 원의 벌금을 내는 처지가 되자 한겨레신문사에 1억 3천 만 원을 기부해 벌금을 대신 내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지원, 만해마을의 200억 원 자산을 동국대에 기증하였습니다. 단적으로 스님은 불사금을 저축하거나 불사에 쓰지 않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왔던 것입니다.
무산은 스스로 무식한 노승임을 자처했지만 어린 시절 대장경 원문을 외워 그대로 암송해내는 기억력의 소유자였으며, 시조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시집으로 <아득한 성자>, <마음 하나>, <절간 이야기> 등이 있으며, 현대시조문학상(1992년), 남명문학상(1995년), 가람문학상(1996년), 한국문학상(2005년), 정지용문학상(2007년), 공초문학상(2008년)등을 수상했습니다.
‘천방지축(天方地軸) 기고만장(氣高萬丈) 허장성세(虛張聲勢)로 살다보니 온 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 구나. 억!’은 무산 스님의 게송입니다. 선종에서 도를 깨우친 경지를 표현하기 위한 게송은 선게(禪偈)라고 했는데, 게송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상력에 따라 창작되었습니다.
무산(霧山) 조오현 스님의 시 몇 편
무산(霧山) 조오현 스님의 시 몇 편 무산 조오현 스님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뜨는 해도 다 보고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cafe.daum.net
'지혜의 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순치황제 출가시(順治皇帝出家詩) (1) | 2024.12.29 |
|---|---|
| <생종하처래(生從何處來) 사향하처거(死向何處去)> -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1) | 2024.12.15 |
| 무위진인(無位眞人)과 무위진인(無爲眞人) (1) | 2024.11.03 |
| 「산은 산이요(山是山), 물은 물이로다(水是水)」 (8) | 2024.10.20 |
| 경허 성우선사 행장(鏡虛 惺牛禪師 行狀) (8) | 202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