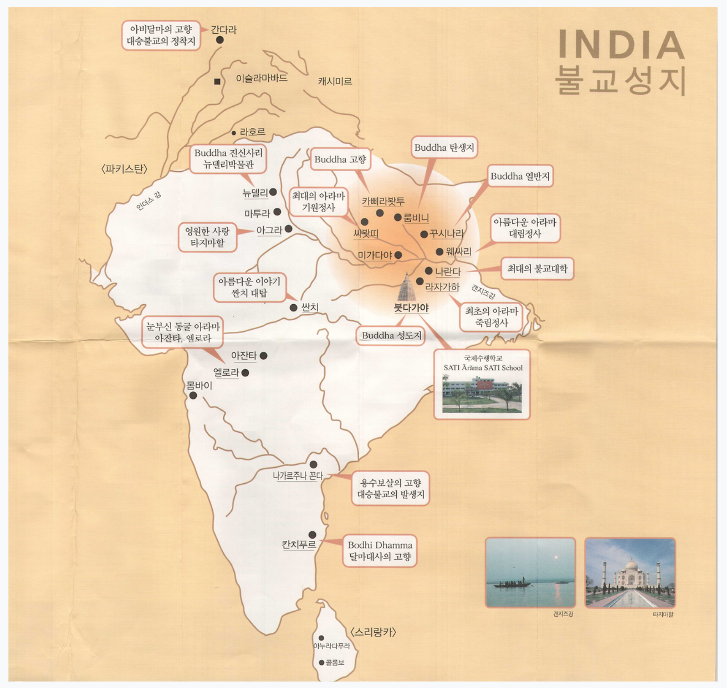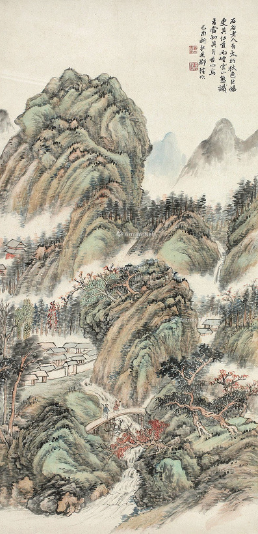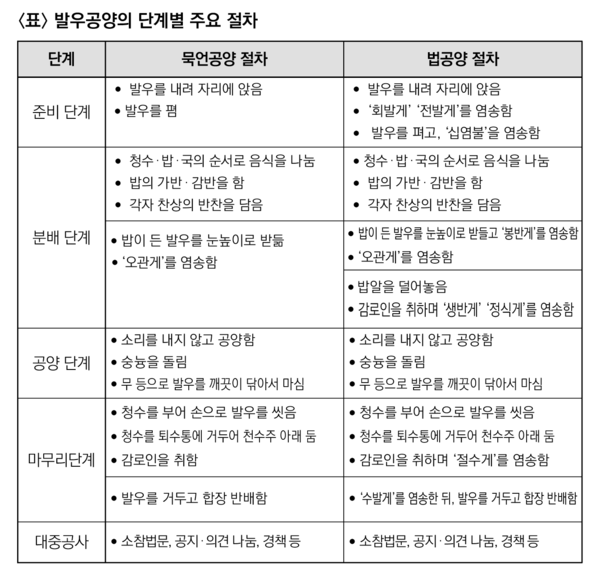물질불멸(物質不滅)의 원리(原理) 일체(一切)법의 유무(有無)가 불즉불리(不卽不離)인 이때에 생사(生死)와 열반(涅槃)이다르지 않고 무명(無明)과 실성(實性)이 다르지 않으니 물질도 영원히 존재한다.그래서 환상(幻相)과 실상(實相)이 불이(不二)임을 실상(實相)심이라 하며미몽(迷夢)이 곧 본성(本性)심이며 산하대지(山河大地) 두두물물(頭頭物物)이우주의 대(大)진리인 청정법신(淸淨法身)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전신(全身)이다. 산야(山野)에 있는 고목(枯木)을 물론 죽었다고 말할 것이다. 아생여사 아사여사(我生汝生 我死汝死)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라고 보는 것이 옳게 본 것이다. 고목뿐이 아니라 소라를 잡아서 삶아 알맹이를 까서 먹었다.그 소라는 껍질 만 남아 있는데 성품(性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