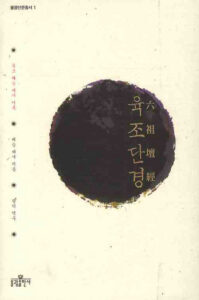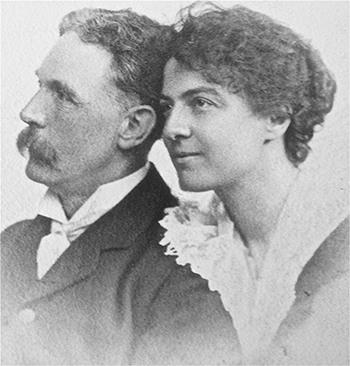특집 | 불교경전의 번역과 유통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에서 불교나 인도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어나 산스끄리뜨어를 번역한 경전이나 문헌을 한 번쯤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출판물을 본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과는 달리 근대적 학문을 늦게 발전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면 원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이른 시기에 빨리어 경전이나 범어 경전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었음을 알게 된다. 1938년에 발간된 《불교사(佛敎社)》(新版)에는 윈터니츠(Winternitz) 교수의 〈원시불교(原始佛敎)에서의 아(我)와 무아(無我)〉라는 논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