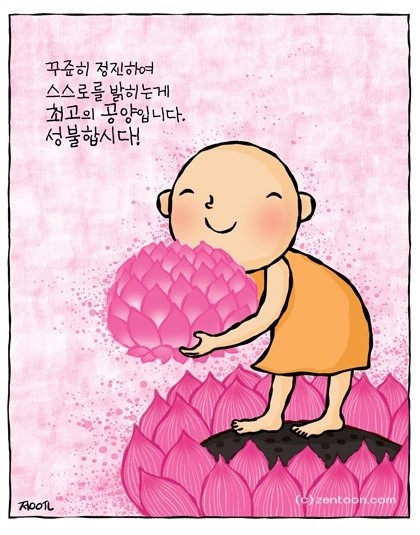증지라야 아는 바이지 다른 경계는 아니네
나와 너의 분별(分別)을 넘어서
전체가 하나의 지(智)로 나타나는 순간이
증지(證智)입니다.
능소(能所)가 한 삶으로 있는 것,
나와 너가 일법계(一法界)가 되어 열린
마음의 활동이 증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空性)이 그대로 나타난
진여(眞如)의 모습입니다.
증득(增得)된 깨달음의 노래
분별을 떠나 있는 삶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對象)과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대상이 그대로 마음이고 마음이 그대로 대상이 된 나눔 이전의 삶입니다. 이 삶은 이름과 모양으로 알 수 없으며 고정된 동일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각(智覺)에 의해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의식(自意識)을 넘어서는 순간, 곧 삼매(三昧)에 드는 순간 체험된 세계입니다. 이를 증지(證智)라고 합니다.
나와 너의 분별을 넘어서 전체가 하나의 지(智)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아는 자[能]와 열려지는 것[所]이 없이 그저 앎으로 하나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능소(能所)의 분별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삼매 체험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부득이 증지라야 아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증지(證智), 곧 삼매 속에서는 능지(能知)가 곧 소지(所知)이고 소지가 곧 능지로 된 앎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증지에 이르게 되면 알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열린 마음의 지헤에서 한삶으로 사는 자비가 실천될 뿐입니다. 능소가 한삶으로 있는 것, 나와 너가 일법계가 되어 열린 마음의 활동이 증지인 무문별지(無分別智)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며 진여(眞如)의 모습입니다.
반야지혜(般若智慧)가 실재의 삶에서 드러났다고 해서 반야의 모습, 공과 진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강경(金剛經)>에서는 '반야가 반야가 아니요, 반야라고 부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앞서 생멸(生滅)과 동정(動靜)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생멸이 불생불멸(不生不滅)에서 생멸이었으며 동정이 부동부정(不動不靜)에서 동정이었듯이, 반야도 반야 아닌데서 반야입니다.
이 모두가 이름과 모양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데서 제 모습을 나투고 있을 뿐입니다. 반야, 공, 진여 등의 밀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 삶의 흐름은 어느 순간을 고정하여 동일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더구나 연기관계의 중첩된 모습을 하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방편으로 언어와 모양을 사용하여 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삼법인(三法印)도 삶의 온전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빔[空] 가운데 지혜로 제 모습[眞如]을 드러내는 것, 곧 결정된 실체를 갖지 않는 무아, 무상의 빈 모습이, 시공을 넘어서 모든 모습으로 드러나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분별을 떠난 일체가 제 모습대로 여여[涅槃]합니다.
곧 반야가 반야가 아닌 데서, 공조차 공인 공공(空空)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진여가 삼법인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과 말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만이 방편(方便)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正和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출처 : 淨土를 그리며...
글쓴이 : 느린 걸음 원글보기
메모 :
'법성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제6구 不守自性隨緣成 (0) | 2018.11.11 |
|---|---|
| [스크랩] 제5구 眞性甚深極微妙 (0) | 2018.10.28 |
| [스크랩] 제3구 無名無相絶一切 (0) | 2018.10.28 |
| [스크랩] 제2구 諸法不動本來寂 (0) | 2018.10.21 |
| [스크랩] 제1구 法性圓融無二相 (0) | 2018.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