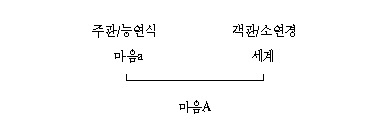무구(無咎)의 불교 기본교리 요약 I. 불교와 예절 (1) 종교 종교는 인간을 정화하고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며,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마르크스: 종교는 인민의 아편 (종교가 그 사회에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갈등만 양산하는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에서 바라본 것) (2) 불교의 특징: 깨달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지혜의 종교, 자비의 종교, 평등의 종교, 평화의 종교 ① 깨달음의 종교: 불교는 스스로 깨달음, 즉 자각(自覺)의 종교다. 다른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자각하여 부처가 되는 종교다. 즉, 타력문(他力門)이 아니라, 자력 문(自力門)이다. ②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