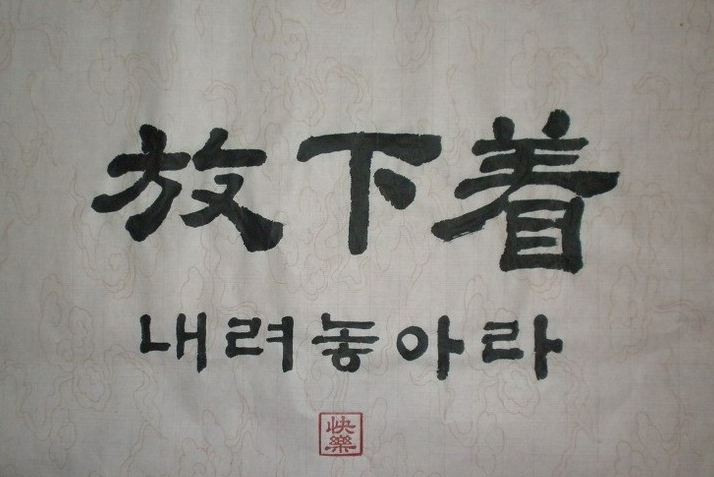진시황제(秦始皇帝)는 전국 칠웅 진나라의 제31대 왕이자, 중국 최초의 황제이다. 성은 영(嬴), 이름은 정(政) 혹 조정(趙政)이다. 혹, 씨는 진(秦), 조(趙)다. 장양 왕과 조희 사이에서 태어났다. 기원전 246년부터 기원전 210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241년까지 여불위가 섭정을 하였고 241년 ~210년 붕어할 때까지 친정을 하였다. 불로불사에 대한 열망이 컸으며, 대규모의 문화 탄압 사건인 분서갱유를 일으켜 수양제와 더불어 중국 역사상 최대의 폭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도량형을 통일하고 전국 시대 국가들의 장성을 이어 만리장성을 완성하였다.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 제도와 군현제를 닦음으로써, 이후 2천년 중국 황조들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중국 진시황은 13살에 즉위해서 38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