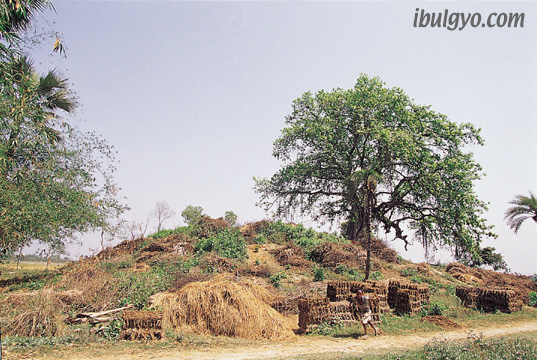선시(禪詩) 80수 감상 1.- ● 過古寺 -- 淸虛休靜 (옛 절을 지나면서 --청허휴정) 花落僧長閉 (호락승장폐) 꽃 지는 옛 절문 오래 닫혔고 春尋客不歸 (춘심객불귀) 봄 따라온 나그네 돌아갈 줄 모른다. 風搖巢鶴影 (풍요소학영) 바람은 둥우리의 학그림자 흔들고 雲濕坐禪依 (운습좌선의) 구름은 앉은 중의 옷깃 적신다. 2.- ● 蘭(난)법사에게 주다 -- 四溟惟政 (사명유정) 萬疑都就一疑團 (만의도취일의단) 만가지 의심을 한가지 의심에 뭉쳐서 疑去疑來疑自看 (의거의래의자간)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가면 스스로 보리라. 須是拏龍打鳳手 (수시나룡타봉수) 용을 잡고 봉황을 치는 솜씨로 一拳拳倒鐵城關 (일권권도철성관) 한 주먹으로 철성관[話頭]을 넘어뜨려라. 3. - ● 懶翁慧勤 (나옹혜근) 阿彌陀佛在何方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