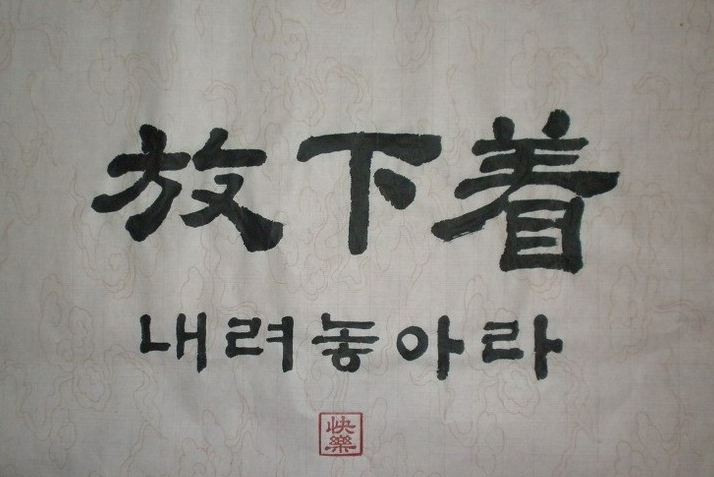제29조 신광 혜가 (神光慧可) (528~593) 보리 달마의 법을 이은 2대 조사 혜가(慧可, 487~593)의 성은 희씨(姬氏)다. 어머니가 이상한 광채가 집안에 비치는 꿈을 꾸고 그를 낳으니 이름을 광광(光光)이라고 불렀다. 그는 30세에 향산사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 그가 출생한 시대는 중국이 남북조로 나뉜 복잡다단한 때였다.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 있었고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마치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어려서부터 총명한 데다 용모가 수려해 부모의 자랑이던 그는 노장과 유학 사상을 깊이 공부했는데 특히 '시경' '역경'에 정통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어지러운 세상살이에 염증을 느끼고 세속의 지식이 궁극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아 불문에 들어선다. 그가 출가한 곳은 낙양 용문의 ..